|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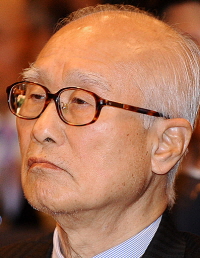 |
|
| 김우중 전 대우회장 |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신장섭 국립 싱가포르대 교수와의 대담(<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이 자신을 아들처럼 아꼈다고 술회했다. 박대통령은 그를 '우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회장도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모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도 주지 않았으며, 청와대를 방문할 때마다 선물도 갖고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과의 비밀회동 비화도 밝혔다. 김일성과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및 남북경협문제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는 것. 김정일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북한 관리들은 "이제 김우중 죽었다. 남한에 못돌아간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대우차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대중정부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GM과의 협상이 진행중이었는데도, 이헌재위원장이 "GM과의 협상이 깨졌다"고 밝혔다는 것. 이헌재의 이같은 발언은 GM에 대우차를 넘기려는 고도의 책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그룹 해체와 대우차 매각 논란은 앞으로 김우중 회장과 김대중 정부시절 이헌재 금감위원장, 강봉균 경제수석 경제관료간에 다시금 뜨거운 진실공방이 벌어질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회장이 신장섭 교수와 대담해서 펴낸 책(<김우중과의 대화>)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신흥국에서의 사업은 단순히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의 시장 거래가 아니라 정부, 정치인, 관료들을 상대해야 하고, 이들에게 경제발전의 정신과 수단을 함께 제공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김 회장은 한국에서 이미 수출 선도, 중화학산업 부실 해결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업발전을 함께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을 상대할 때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을 ‘세계를 경영한 민족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흥국 진출은 정치-경제-기업의 오케스트라이다. ‘민족주의자’와 ‘세계경영’이 얼핏 보면 상충하는 단어들처럼 느껴지지만, 신흥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경영’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서로 보완되는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김우중회장= 우리가 (박 대통령) 정부와 가까웠던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정부가 골치 아파 하는 일들을 해줬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로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중화학산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부에서 나한테 떠맡기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된 거지요.
그리고 경제발전을 하려면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서 잘해야 돼요. 합심해서 노력하는 걸 놓고 ‘정경유착’이라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장사꾼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라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장사꾼이 돈만 바라보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신장섭=그러면 정치자금이나 통치자금을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김회장=박 대통령께서 나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지요. 나를 ‘김 사장’이나 ‘김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중아’라고 부르셨으니까요. 나도 박 대통령을 아버님처럼 생각했고요…. 아버님 같은 분에게 그런 (부탁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고요. 중간에 그런 말 들어가면 혼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박 대통령께 돈 십 원 갖다 준 게 없어요. 만나러 갈 때 선물 하나 갖고 간 적도 없으니까요.
| |
 |
|
| 신장섭 교수 |
박 대통령이 나를 아껴줬던 건 내가 수출 많이 하고, 중화학산업 부실 처리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 (박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배석자 없이 오래 얘기를 나누는 적이 많았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요.
김회장=그러길래 나도 받아쳤지요. ‘내가 외교관이냐 관리냐, 알다시피 나는 메신저(messenger, 전달자)인데 싫다면 안 하겠다. 그렇게 (남한 측에) 전하라면 그대로 전하겠다. (남북한이) 서로 잘 해보자는 얘기인데 나와 상대하는 것이 싫으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자’고 했어요. … 조금 있다가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앉으라고 그래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이제 김우중 죽었다. 남조선에 못 간다’고 했대요.
신교수=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회장=김일성 주석이 점심 먹으러 들어가면서 나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김정일이) 한 6년 후배인데 젊은 사람이니까 이해하라’고 얘기해요(웃음. 김우중은 1936년생이고 김정일은 1942년생이다. 당시 55세와 49세였다. 김일성에게는 50살이 다 된 아들이 아직까지 젊은 사람으로 보였는지 모른다).
김회장=그러니까 나도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해요. 우리 회사에 영향이 올까 봐 …. 사장들도 계속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DJ에게 말했어요. ‘앞장서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대통령을 도와 발언하다가) 우리 대우가 잘못되면 (내가) 망신당하겠다. 제발 (나를) 부르지 마시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그것 하나 못 막겠느냐. 책임진다’고 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했던 거지요.
신교수=처음부터 DJ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까?
김회장=DJ를 믿었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얘기했지, 내가 망하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섰겠어요? 그런데 (밑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올라오니까 (DJ) 생각이 달라졌겠지요.
신교수=대우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김 회장님이 해외에 나갈 때에(1999년 10월) 8개 계열사를 경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회장=글쎄요…. 그 약속은 지켰어야지…. 금감위도 그렇게 얘기했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신문에도 다 났던 얘기인데…. 무슨 이유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요. (그동안) 들은 바도 없고….
신교수=그런데 왜 협상이 갑자기 결렬됩니까?
김회장=결렬된 적이 없어요.
신교수=이헌재 씨는 GM이 1998년 7월에 협상을 깼다고 했는데요.
김회장=그때는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5월에 휴스가 한국에 왔을 때 나한테 ‘빨리 해서 9월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보겠다’고 했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에요. 그 후에도 GM이 협상 깬다고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없었고요. 이헌재 씨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다가 회고록에서 뒤늦게 (2012년 발간) 그렇게 말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신교수=그게 무슨 얘기지요?
김회장=7월부터 정부가 우리 대우를 겨냥한 유동성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GM은 나중에 대우차를 인수해서 큰돈을 벌었어요. 대우 해체시킨 다음에 대우차를 거의 공짜로 GM에 넘겼는데, 그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대우차는 이미 부실이었고, GM도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부실이 더 커지지 않게 7월부터 (대우그룹에 대한) 유동성 규제에 들어가서 수습하려고 했다. 그리고 대우차는 워낙 부실이었으니까 헐값에라도 빨리 GM에 넘기는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회장=지금 GM이 군산공장과 부평공장을 대폭 축소하는데 그게 주로 한국 내수만 바라보고 차를 팔던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 한국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정책결정자들 중에서 산업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회사를) 외국 회사에 팔면 저절로 (국가경제가) 잘될 거라고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지요.
신교수=처음에 회장님께서 GM에게 자동차 경영을 배워보겠다며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고, ‘월드카’ 문제로 GM과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GM지분을 인수해서 세계경영에 나섰는데, 세계경영 완성을 목전에 두고 대우그룹이 해체된 뒤 회장님과 임직원들은 온갖 고초를 겪고 대우차는 GM에 헐값에 넘겨져 단물 다 빨린 뒤 다시 GM의 내수 하청기지로 전락한 거네요. 대우차의 스토리는 비극적인 서사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비극이기도 하고, 한국경제의 비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우그룹의 해체과정은 너무 일방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것 같다. 역사는 ‘승자(勝者)의 역사’라고 하지 않았던가. 패자(敗者)에게는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쉽게 돌팔매질이 가해진다.
김 회장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전달해서 그 불균형의 추(錘)를 일단 조금이라도 밀어보려고 시도했다.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대우 흥망사, 한국 현대경제사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김 회장은 ‘흔적’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대우가 해체된 후 심정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해 “그저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기는데 흔적이라도 남겼으니 말이에요”라고 답한다. 김일성을 만나 남북화해를 권고할 때에도 “최선을 다 했다는 흔적이라도 역사에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한다.
GYBM 학생들 키우는 일이 자신의 ‘마지막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오랜 대화를 거쳐 나오게 된 이 책이 김 회장의 흔적을 역사에 제대로 남기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글을 쓴 사람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