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얼마 전에 만난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기업을 '돌멩이'에 비유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업은 점점 더 둥근 형태의 돌이 되어갑니다. 세상의 변화에 매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 비유대로라면 최근 금융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통합은 '둘이었던 돌멩이가 하나로 뭉쳐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면이 둥근 두 개의 돌멩이는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사용해도 단단히 붙지 않는다. 이미 각자만의 방식대로 충분히 매끄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으로 탄생한 KEB하나은행,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쳐진 KB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하나가 된 미래에셋대우 등은 모두 통합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두 조직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기업들이기에 결합에서 파생된 마찰은 그 자체로 '살아있음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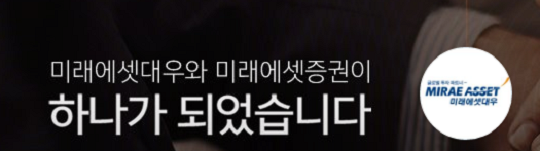 |
|
| ▲ 사진=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
자기자본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이번 통합으로 '국내 최대 증권사'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세상은 언제나 1등에게는 '완벽'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서 조금만 미달해도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하물며 기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간의 조직 분위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우증권은 수평적인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수직적 조직문화가 지배적이었다. 대우증권노조는 금융계 대표적인 '강성노조'였지만 미래에셋에는 노조가 아예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사갈등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원-대리-과장-차장 등 기존 4개였던 직급을 2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 노조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노조 측은 '통합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휴 직전에는 '선물세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역시 크게 보면 노사갈등이다. 선물세트 가격이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맞춰지다 보니 원래 더 비싼 선물을 받았던 대우증권 출신 사원들로선 실망감이 존재했던 것. 한 관계자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계속 서운한 부분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작은 오해가 켜켜이 쌓여 '조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로서는 '하나의 돌멩이'가 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물리적인 결합 이상의 '화학적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보려는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법률 체계가 발달한 로마 사회가 의외로 인정(人情)을 중시하는 문화를 함께 발달시켰다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로마인이 창안한 법 개념과 의리나 인정은 모순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은 엄정하게 시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성과 마찰을 일으키기 쉬운 법이지만, 그것을 막는 윤활유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의리와 인정이 아닐까. 법 개념을 확립한 로마인이기 때문에 윤활유의 중요성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두 돌멩이를 성공적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둘 사이를 메워줄 수 있는 '끈끈한 흙'이 필요하다. 미래에셋대우가 과연 어떤 흙을 이용해 '굳히기'에 나설지 궁금해진다. 각자의 성분을 잘 이해해서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할 경우 미래에셋대우라는 이름의 돌멩이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있을 것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